<예수전>가까이 두고 때때로 읽어 볼 책
김규항의 글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오늘도 거리에서 불의한 세상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나, 안온하고 평이한 삶을 거부한 채 고단하고 질척이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늘 느끼는 부끄러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과 같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던 고 김대중 선생의 말을 새기면서도 하루하루 벌레처럼 살아가는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뭔가? 사람이 어떤 다른 정신에 장악되어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눈과 입이 돌아가고 미친 말을 해 대는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진짜 심각한 귀신 들림은 오히려 겉보기엔 멀쩡해서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태다. 이를테면 오늘 우리는 이른바 ‘행복과 미래’를 얻기 위해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느라 정작 단 한순간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 채 인생을 소모하는, 돈 귀신에 들린 ‘멀쩡한’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이 볼 수 있다. -- <예수전> p35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가 김진숙이나 체 게바라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양심이 악의 편에 좀먹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게 노력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최소화하는 것이리라 자위한다. 그렇게 늘 깨어 있기 위해 나는 김규항의 책 <B급 좌파>와 <나는 왜 불온하가>를 가까이에 두고 때때로 아무 페이지나 열어서 읽어 보곤 한다.
거기에 씌어 있는 어떤 문장도 단숨에 쓰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 없다. 한 자 한 자가 온몸의 피를 쥐어짜듯 토해져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된 그의 글에는 아픔, 고민, 사색, 진정성이 있고 거기에서 정신, 분노, 저항,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제 그의 <예수전>도 앞으로 두고두고 내 가까이에 놓고 때때로 아무 페이지나 열어서 읽어 볼 책 목록 중 하나가 되었다.
예수는 한 사람의 변화가 우주의 변화인, 우주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인 그런 변화와 그런 혁명을 바란다. -- p169
중세 카톨릭 만큼이나 부패하고 타락한 오늘날의 개신교와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신도들로 인해 예수와 그의 가르침이 폄하되어 본질이 흐려지고는 있으나, 예수의 삶과 죽음을 온전하게 모두가 받아들인다면 마침내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하느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이야기한다.
예수는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이란 어떤 대상에게 나를 완전히 여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란 하느님에게 나를 완전히 여는 것이다. …(중략)… 하느님은 교회나 기독교의 성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에 관련하며 온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존재다. 믿음은 결국 하느님 나라, 즉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꿈이다. -- p185
물론 나도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인가라는 회의는 든다. 김규항도 본문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회 성원의 이해와 정체성이 완벽하게 하나인 세상이 아닌 한 불평등한 관계는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설혹 모든 사회 성원의 이해와 정체성이 완벽하게 하나로 모아진다 하더라도 욕망이 거세된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동은 고사하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발적 노동이 이어질 수 있을까? 모두가 김진숙이나 체 게바라가 될 수 없듯이 모두가 예수가 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에서도 언젠가 웃음 지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는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긍정적인 에너지로 세상을 충만케 하고 있다. 그 에너지가 모이고 모이면 거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의 관계로 세상은 무한 수렴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변화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꿈을 꾼다며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사람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끈기 있는 노력에 의해 일어난다.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변화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비현실적이라 느껴지던 세상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일어나는 혜택은 시나퍼의 그늘처럼 모든 사람, 그들을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은 물론 그들을 적대하고 탄압한 사람들에게까지 고루 나누어진다. 역사에서 보듯 세상의 변화는 늘 그래 왔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쉬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p80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이 결국 예수의 가르침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벌레처럼 오늘도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제나 깨어있기만 한다면, 그 변화에 조금씩 조금씩 동참해 가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정히 억울하면 벽에 소리라도 질러보면서...
우리가 애끊는 순간은 낯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 아이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대면할 때다. 그런데 예수는 난생처음 만난 나병환자에게 애끊는다. 바로 이것이 예수라는 사람의 속내이며 행동의 원천이다. 예수의 모든 행동은 ‘모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애끊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의 분노 역시 애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애끊는 마음이 자연스레 그들의 고통을 낳는 사람들과 사회체제에 대한 강렬한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에게서 배우는 일 역시 ‘모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애끊는 마음’을 갖는 일에서 출발한다. -- p38~39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리 천하고 막돼 먹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품위 있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악다구니를 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반대로 1년 내내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도 충분히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품위를 잃을 행동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사람은 품위 있는 사람과 품위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다. -- p59
진정한 나눔은 적선이나 자선이 아니라 적선과 자선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나눔은 ‘불쌍한 사람’과 그 불쌍한 사람을 돕는 ‘훌륭한 사람’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벌이는 우스꽝스러운 쇼가 아니라, 누구든 제 능력과 개성에 맞추어 정직하게 일하는 것만으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자존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다. 나눔은 자연도 자원도 돈도 식량도 집도 땅도 모두 하느님의 것임을 깨닫는 것이며, 하느님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고루 나누어 쓰라고 한 것이기에 누구에게도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모두 함께 풍요롭고 만족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 p110
사람이란 대개 보고 듣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는다. 믿는다는 건 실은 욕망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인 것이다. 이를테면 오늘 사회의식을 가졌다는 많은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말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극복될 수 있다는 건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중세의 암흑을 무너트리는 훨씬 더 어려운 변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바로 그 덕에 그들 스스로가 법적인 차원에서나마 평등과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는 이유는 실은 그들이 그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반대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지, 비인간적인 자본주의를 진짜 극복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의 지난함, 그리고 그 극복이 가져올지 모르는 제 얼마간의 기득권과 사회적 지위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하는 일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구석에 끼어 안온하게 생을 보내는 일을 분명히 선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되지도 않은 논리로 제 탐욕과 이기심을 드러내며 자본주의를 찬미하는 막돼 먹은, 그래서 많은 인민들에게서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입만 벌리면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많은 인민들에게서 양식을 가진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나 절대 자본주의가 극복되길 바라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들이다. -- p112~113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쌓은 부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하느님의 축복이라 여겨진다. 여기에서 ‘정당한 방법’이란 ‘합법적인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법이란 한 사회의 지배세력이 자신들의 이해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사회 성원들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공정한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 성원의 이해와 정체성이 완벽하게 하나인 사회가 아니라면, 모든 사회 성원에게 공정한 법은 존재하려 해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은 어느 탈옥수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작은 잘못에 엄격하지만 힘세고 부자인 사람의 큰 잘못엔 늘 관대하다. 그런 현실에서 부가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는 주장이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쌓은 부는 정당하다는 주장은 기만적인 것이다. -- p161
비폭력주의는 오로지 폭력의 현장에서만 주장될 수 있다. 제국의 미사일 공격에 제 새끼가 찢겨 죽은 어미가 죽음보다 더한 슬픔을 뚫고 ‘우리는 똑같은 폭력의 보복을 해선 안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도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폭력의 현장에서 멀찍이 떨어져 1년 내내 뺨 한번 맞을 일 없는 사람이 점잖은 얼굴로 ‘저항으로서 폭력도 폭력이다’라고 뇌까리는 건 참으로 몰염치한 짓이며 폭력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폭력보다 더 끔찍한 폭력이 된다.
비폭력주의의 목표는 ‘비폭력’이 아니라 ‘저항’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예수는 결코 안온한 예배당이나 연구실에서 비폭력론을 주장하지 않았다. 예수는 언제나 폭력의 현장에서 그 폭력을 몸으로 감당하며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20세기 비폭력주의 운동의 대명사’라 일컬어지지만 일각에서는 인도 ‘민족’에 집착하여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훼방한 사람으로 비판받기도 하는 간디조차 ‘무기력하고 비굴한 비폭력보다는 차라리 정당한 폭력이 낫다’고 말했다. 비폭력주의는 폭력적인 투쟁 방법을 넘어서는 투쟁 방법이지 폭력적인 투쟁 방법에도 못 미치는, 투쟁의 정당성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모도하려는 유약한 인텔리들의 요사스러운 말장난이 아니다. 진정한 비폭력주의자들이 결국 폭력에 희생당하는 운명을 갖는 건, 지배체제가 그들에게서 무장투쟁을 선택한 운동가들보다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 p238~239
‘예수는 사랑과 용서의 결정체’라 말하는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의 결정체인 그가 왜 사형당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형당하는 사랑과 용서의 결정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예수가 영성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영성가인데 왜 사형당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형당하는 영성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예수가 비폭력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비폭력주의자인데 왜 사형당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형당하는 비폭력주의자’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서 예수의 모습에서 제 마음에 드는 한 부분만 똑 떼어 내어 예수는 사랑과 용서의 결정체입네, 예수는 영성가입네, 예수는 평화주의자입네 하는 것은 예수를 욕보이는 일이다. 사형은커녕 1년 내내 뺨 한번 맞을 일 없이 안락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흉내로 세상의 존경과 명예를 구가하는 건 예수를 팔아먹는 짓이다.
사회적 모순이 존재하는 한, 다들 세상이 좋아지고 달라졌다고 해도 어느 한 귀퉁이엔가 인간으로서 위엄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예수를 좇는 사람은 지배체제와 불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가 살던 세상처럼 지배체제와 불화했다고 쉽게 죽임을 당하는 세상은 아니다. 그러나 지배체제의 직간접적 탄압과 주류 사회에서의 배제,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에게서(심지어 같은 길을 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일어나는 오해와 곤경은 다르지 않다. 지배체제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오해와 곤경에 처하지 않으면서, 이쪽에서도 칭찬받고 저쪽에서도 존경받으면서, 예수를 좇고 있다 말하는 건 가소로운 일이다. -- p255~256
<1Q84> - 먹을 게 없는 소문난 잔치
상다리가 휘어지게 내어 온 음식은 푸짐하고 풍성했다. 군침을 돌게 하는 냄새는 저절로 의자를 당겨 앉게 했다. 어떤 것부터 먼저 먹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수저를 들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음식마다 뭔가가 빠져 있었다.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말 맛있다고 먹을 수는 없는 맛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너무나 맛있다는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10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생전 처음 먹는 진수성찬이라면서 칭찬을 늘어놓지만, 나는 도통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에게는 먹을 게 없는 소문난 잔치인 셈이다.

거기에 조지 오웰의 <1984>를 연상케 하는 <1Q84>라는 제목에서 노골적으로 암시하였다시피 빅브라더와 유사한 리틀 피플이 등장하고 소설 속 소설인 ‘공기번데기’와 ‘고양이 마을’을 통해서 이야기는 더 풍성해진다. 문장은 군더더기를 찾아 볼 수 없게 유려하고 또박또박 쓰여진 단어들은 더할 수 없이 빛난다. 곁가지로 등장하지만 체호프와 길랴크인, 칼 융은 소설 속의 은유로 훌륭하게 작용한다. 그다지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도, 그다지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도, 그다지 박진감 넘치는 액션이 벌어지지도 않는 2000여 페이지 중에서 들어냈으면 하는 대목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놀랍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게 되면, 허탈해진다. 진수성찬의 음식을 맛보고 있는데 뭔가가 빠진 기분을 느끼게 된다. 싱겁지도 너무 짜지도 않고 갖은 양념의 맛이 느껴지는데 군침이 도는 맛은 아닌 그런 기분이다. 빅브라더를 모방한 것에 불과한 리틀 피플의 존재감과 그들이 만드는 공기번데기가 소설 속에서 전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따로 노는 점이 불만스럽고, 아오마메가 대머리 중년에게만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길고도 강한 팔을 지녀서 어디라도 뻗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무색케 하는 조직 ‘선구’의 어이없을 만큼 무기력한 모습에 실소가 나오고, 한없이 늘어진 덴고의 간병 부문은 3분의 1 정도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지만, 그것은 진수성찬에 대한 공연한 트집일 수도 있다.
<1Q84>는 많은 이야기와 은유와 상징을 담고 있지만, 결국 덴고와 아오마메가 어린 시절 겪었던 상실의 트라우마를 사랑의 힘으로 치유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을 2000여 페이지에 걸쳐서 길고도 지루하게 나열한 것뿐이다.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이 장만되었고 먹음직스럽게 내 놓아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하루키 자신이 <상실의 시대>에서 하지 않았던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토록이나 풍성하게 음식을 장만해야 했단 말인가? 그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간다거나 체포가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1984>를 연상할 제목을 달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현실의 고통이 묘파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비록 지금 다시 읽게 된다면 처음 접했을 당시의 감흥과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상실의 시대>는 훌륭한 작품이고, <1Q84> 역시 문학적으로 분명 훌륭한 작품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신자유주의 마지막 발악이 광포하게 세계를 뒤덮고 있으며 끊임없이 탄압받고 있는 인간 정신의 절대 자유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지금의 ‘1984’를 <1Q84>는 진수성찬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양념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예수전>가까이 두고 때때로 읽어 볼 책 (1) | 2011.12.04 |
|---|---|
| <1Q84> - 먹을 게 없는 소문난 잔치 (0) | 2011.09.30 |
| 자작나무 (0) | 2008.03.17 |
| 봄비 (0) | 2008.03.16 |
| 러브 레터 (0) | 2008.03.14 |

로버트 프로스트
꼿꼿하고 검푸른 나무줄기 사이로
자작나무가 좌우로 휘어져 있는 걸 보면,
나는 어떤 아이가 그걸 흔들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흔들어서는 눈보라가 그렇게 하듯
나무들을 아주 휘어져 있게는 못한다.
비가 온 뒤 개인 날 겨울날 아침
나뭇가지에 잔뜩 얼음이 쌓인 걸 본 일이 있을 것이다.
바람이 불면 흔들려 딸그락 거리고
그 얼음 에나멜이 갈라지고 금이 가면서 오색찬란하게 빛난다.
어느새 따뜻한 햇빛은 그것들은 녹여
굳어진 눈 위에 수정 비닐처럼 쏟아져 내리게 한다.
그 부서진 유리더미들을 쓸어 치운다면
당신은 하늘의 속 천정이 허물어져 내렸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나무들은 얼음 무게에 못 이겨 말라붙은 고사리에
끝이 닿도록 휘어지지만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
비록 한번 휜 채 오래 있으면 다시 꼿꼿이 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하여 세월이 지나면 머리감은 아가씨가 머리를 햇볕에 말리려고
무릎꿇고 엎드려 머리를 풀어 던지듯
잎을 땅에 끌며 허리를 굽히고 있는 나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얼음사태가 나무를 휘게 했다는 사실로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소를 데리고 나왔던 아이가
나무들을 휘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시골 구석에 살기 때문에 야구도 못 배우고
스스로 만들어 낸 장난을 할 뿐이며,
여름이나 겨울이나 혼자 노는 어떤 소년.
아버지가 키우는 나무를 하나씩 타고 오르며 가지가 다 휠 때까지
나무들이 모두 축 늘어질 때까지 되풀이 오르내리며 정복하는 소년.
그래서 그는 나무에 성급히 오르지 않는 법을
그리하여 나무를 뿌리 채 뽑지 않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오를 자세를 취하고
우리가 물이 찰찰 넘치는 잔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기어오른다.
그리고 몸을 날려 발이 먼저 닿도록 하면서
휙 하고 바람을 가르며 땅으로 뛰어 내린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자작나무를 휘어 잡는 소년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걱정이 많아지고 인생이 정말 길 없는 숲 같아서
얼굴이 거미줄에 걸려 얼얼하고 근지러울 때
그리고 작은 가지가 눈을 때려 한쪽 눈에서 눈물이 날 때면
더욱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이 세상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와서 새출발하고 싶어진다.
그렇다고 운명의 신이 고의로 오해하여 내 소망을 반만 들어주면서
나를 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게 아주 데려가 버리지는 않겠지.
세상은 사랑하기에 알맞은 곳.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곳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자작나무 타듯 살아가고 싶다.
하늘을 향해 설백의 줄기를 타고 검은 가지에 올라
나무가 더 견디지 못할 만큼 높이 올라 갔다가
가지 끝을 늘어뜨려 다시 땅 위에 내려오듯 살고 싶다.
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좋은 일이다.
자작나무 흔드는 자보다 훨씬 못하게 살 수도 있으니까.

Birches
Robert Frost
When I see birches bend to left and right
Across the line of straighter darker trees,
I like to think some boy's been swinging them.
But swinging doesn't bend them down to stay.
Ice-storms do that. Often you must have seen them
Loaded with ice a sunny winter morning
After a rain. They click upon themselves
As the breeze rises, and turn many-colored
As the stir cracks and crazes their enamel.
Soon the sun's warmth makes them shed crystal shells
Shattering and avalanching on the snow-crust?
Such heaps of broken glass to sweep away
You'd think the inner dome of heaven had fallen.
They are dragged to the withered bracken by the load,
And they seem not to break; though once they are bowed
So low for long, they never right themselves:
You may see their trunks arching in the woods
Years afterwards, trailing their leaves on the ground
Like girls on hands and knees that throw their hair
Before them over their heads to dry in the sun.
But I was going to say when Truth broke in
With all her matter-of-fact about the ice-storm
(Now am I free to be poetical?)
I should prefer to have some boy bend them
As he went out and in to fetch the cows?
Some boy too far from town to learn baseball,
Whose only play was what he found himself,
Summer or winter, and could play alone.
One by one he subdued his father's trees
By riding them down over and over again
Until he took the stiffness out of them,
And not one but hung limp, not one was left
For him to conquer. He learned all there was
To learn about not launching out too soon
And so not carrying the tree away
Clear to the ground. He always kept his poise
To the top branches, climbing carefully
With the same pains you use to fill a cup
Up to the brim, and even above the brim.
Then he flung outward, feet first, with a swish,
Kicking his way down through the air to the ground.
So was I once myself a swinger of birches;
And so I dream of going back to be.
It's when I'm weary of considerations,
And life is too much like a pathless wood
Where your face burns and tickles with the cobwebs
Broken across it, and one eye is weeping
From a twig's having lashed across it open.
I'd like to get away from earth awhile
And then come back to it and begin over.
May no fate wilfully misunderstand me
And half grant what I wish and snatch me away
Not to return. Earth's the right place for love:
I don't know where it's likely to go better.
I'd like to go by climbing a birch tree,
And climb black branches up a snow-white trunk
Toward heaven, till the tree could bear no more,
But dipped its top and set me down again.
That would be good both going and coming back.
One could do worse than be a swinger of birches.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예수전>가까이 두고 때때로 읽어 볼 책 (1) | 2011.12.04 |
|---|---|
| <1Q84> - 먹을 게 없는 소문난 잔치 (0) | 2011.09.30 |
| 바위 (0) | 2010.11.10 |
| 봄비 (0) | 2008.03.16 |
| 러브 레터 (0) | 2008.03.14 |

사촌 동생의 결혼식이 있어 대절한 버스를 타고 청주에 다녀왔다.
비가 종일 내리다 그치다 내리기를 계속하였다.
관광버스를 타고 야유회를 가듯 왁자한 버스안의 소란스러움에
책을 읽기도,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도 어려웠다.
물방울이 점점이 묻어 있는 버스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았다.
유리창 너머 세상이 점차 흐릿해지고 물방울들이 점차 또렷해졌다.
유리창이라는 엄폐막에 의해 나는 세상과 유리되어 있었고
그나마 유리창 너머의 풍경도 물방울들에 의해 굴절되어 투영되었다.
봄 비
변영로
나즉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
졸음 잔뜩 실은 듯한 젖빛 구름만이
무척이나 가쁜 듯이, 한없이 게으르게
푸른 하늘 위를 거닌다.
아, 잃은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나즉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
아렴풋이 나는 지난날의 회상같이
떨리는 뵈지 않는 꽃의 입김만이
그의 향기로운 자랑 앞에 자지러지노라!
아, 찔림 없이 아픈 나의 가슴!
나즉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
이제는 젖빛 구름도 꽃의 입김도 자취 없고
다만 비둘기 발목만 붉히는 은실 같은 봄비만이
소리도 없이 근심같이 나리누나!
아, 안 올 사람 기다리는 나의 마음!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예수전>가까이 두고 때때로 읽어 볼 책 (1) | 2011.12.04 |
|---|---|
| <1Q84> - 먹을 게 없는 소문난 잔치 (0) | 2011.09.30 |
| 바위 (0) | 2010.11.10 |
| 자작나무 (0) | 2008.03.17 |
| 러브 레터 (0) | 2008.03.14 |
To L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얼굴을 들고 전화박스 주변을 둘러 보았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곳이 어딘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대체 여기는 어딘가? 내 눈에 비친 것은 어디랄 것도 없이 걸어가는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뿐이었다. 나는 아무데도 아닌 공간의 한가운데에서 미도리를 계속 부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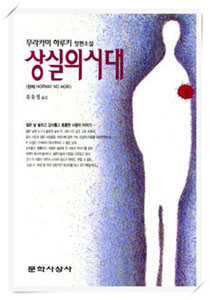
나는....
두렵습니다.
"죽음이 삶의 대극으로써가 아니라 그 일부로써 존재해 있"기 때문인지, 혹은 "언제나 어딘가가 깨져 있고, 그리고 다만 갈증이 있을 뿐"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내가 이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리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구나 나는 "심각해진다는 것은 반드시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어슴프레하게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삶이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건 단지 내가 삶이 이토록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합니다. 그럴때면 나는 가벼운 미소를 짓습니다. 얼굴 근육을 일그러뜨리고 누런 이를 드러내며 무언가 다른 것이 나를 또 힘겹게 하겠지만, 뭐, 어차피 마찬가지겠지, 인생이란... 이라고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보다, 내가 살았었다는 사실, 이토록 막연하고 무감각하게 살아왔었다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결국 그것은 나의 미래가 까마득한 벼랑 위를 올려다 보는 것처럼 당혹스러운 혼돈과 절망으로 인지되어 끝도 모를 나락의 한 중간에 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따위 관념적인 혼란보다도 더욱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 같아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마침내 그를 미워하게 되는 내가 두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고마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두렵고, 상처 받은 이의 가슴에 흉한 발톱자국을 거리낌없이 남기는 내가 두렵고, 그리고 마침내 끊임없이 축적되는 알 수 없는 권태가 나의 모든 신경과 감각을 마비시켜 그러한 두려움조차 깨닫지 못하는 내가 두렵습니다.
나는 항상 절대선이나 절대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편견과 오만이 만들어 낸 궤변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사물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선악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인간에겐 최소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그와 엇비슷하게 생겨 먹은 동류의 인간과 함께 존재해 가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정이나 신뢰, 사랑 같은 것 말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예의를 대부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의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켜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믿음이 점차로 깨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또한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철저히 분쇄되어 단 한조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나를 전율시킵니다. 철저히 소멸된 그러한 예의가 언제 존재하기라도 했었냐는 듯이 무표정하게 걸어가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광포한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무라까미 하루끼가 <상실의 시대>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너저분한 이 편지의 "간명한 테마"입니다.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아의 무게에 맞서는 동시에 외적 사회의 무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from B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예수전>가까이 두고 때때로 읽어 볼 책 (1) | 2011.12.04 |
|---|---|
| <1Q84> - 먹을 게 없는 소문난 잔치 (0) | 2011.09.30 |
| 바위 (0) | 2010.11.10 |
| 자작나무 (0) | 2008.03.17 |
| 봄비 (0) | 2008.03.16 |


